| 이매패강 二枚貝綱 | Bivalvia | ||
|---|---|---|
| 학명 | Bivalvia (Linnaeus, 1758) | |
| 분류 | ||
| 계 | 동물계Animalia | |
| 문 | 연체동물문Mollusca | |
| 강 | 이매패강Bivalvia | |
개요
조개는 한 쌍의 두꺼운 껍데기를 가진 수생 생물을 이른다. 그래서 완족동물도 이매패류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조개라고 부른다. 정의를 더 좁게 해서 이매패류만을 조개라고 하기도 한다.
생태
일반적으로 연체동물문 이매패강(Bivalvia)의 동물을 지칭하며, 두 장의 탄산칼슘 패각(貝殼)으로 몸을 감싸고 있다 분류군의 이름부터 이매패(두 장의 껍데기)강이다. 연체동물문에 속하는 다른 분류군인 두족류(頭足類, 머리에 발이 달림)에 대응하여 부족류(斧足類, 도끼 모양의 발을 가짐, 영어로는 Pelecypoda)라고도 한다.. 실생활에서는 흔히 소라나 고둥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복족류(Gastropoda)와 완족동물 연체동물조차도 아니지만, 복족류와 다르게 이매패류처럼 껍데기를 한 쌍으로 가지고 있어서 더 구분하기 어렵다. 조개사돈과 개맛류가 여기 포함된다.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둥류 중에서도 조개라고 불리는 종류가 꽤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삿갓조개류와 전복류다.
민물이든 해수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분포하며 암수 한 몸인 것도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이 바뀌는 것도 있다.
뻘이나 물을 먹어 그 안의 플랑크톤이나 유기물만 걸러먹는 여과섭식자에 해당한다.
대부분 움직임이 매우 느려 도망가지 못해서 예외적으로 활동성이 상당히 좋은 종류도 몇몇 있다. 가리비는 껍데기를 강하게 여닫으며 뒤로 내뿜는 물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서 제트기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 또한 개량조개나 새조개과에 속하는 다수 종들은 발이 매우 길어 땅을 지구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동물들의 쉬운 먹잇감이었다. 결국 조개 껍데기라는 방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잠시 바다 밑을 점령할 만큼 번성하였으나, 얼마 안 가 다른 포식동물들이 이러한 껍데기쯤은 열거나 깨고도 남을만큼 진화하였고 땅 속으로 숨는 것 외에 방어수단이 일절 없어 현재까지도 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
때문에 천적은 널리고 널렸다. 해달, 새, 불가사리, 고둥, 낙지, 문어, 게, 육식 어류, 인간 등. 해달은 돌로 조개를 깨서 먹으며, 불가사리는 조개 먹는 방법이 특이하다. 소화액을 뱉어 몸 밖에서 소화시킨 후 자기 위를 뒤집어 먹는다. 그리고 고둥은 치설로 껍데기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소화액을 주입해 체외에서 소화시켜 먹으며, 문어와 낙지는 빨판을 이용해 껍질을 연 다음, 속살을 먹는다. 새들 역시 조개를 잘 먹고, 일부 종은 주식이 조개다. 부리로 껍데기를 못 부술 것같이 생긴 새들도 의외로 잘 먹으며, 이들에게 조개는 훌륭한 단백질, 칼슘 공급원이다. 그냥 삼키기도 하고, 돌을 이용하거나 공중에서 떨어뜨려 박살내기도 한다. 도요새 중에는 조개껍데기를 여는 데 부리가 특화된 종류도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불행한 일로 껍데기가 파손되면 회복하지도 못해 자기보다 더 작은 갑각류나 물고기 떼에게 손쉽게 갉아먹힌다. 이렇게 보면 다 잡아먹혀 멸종할 법도 하지만 높은 번식력과 땅 속에서 숨어 살거나, 특정 종들은 단거리으로 각자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등, 어떻게든 굳건히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의 조개는 개량조개로, 발이 매우 길어 유사시 땅을 짚고 뛰어오르는 반동으로 도망칠 수 있다. 육식성인 큰구슬우렁이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며, 가리비처럼 헤엄치는 능력을 지닌 몇 안되는 종 중 하나다.
2013년, 507살을 산 조개 대양대합이라는 제법 깊은 곳에 사는 조개의 일종. 평균수명이 무려 400살이 넘는다.가 아이슬란드 해저에서 발견되었지만 나이를.
화석상으로 제일 오래된 것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는 5억 1200만년전 고생대 초기 미얀마·라오스·베트남 등과 인접해 있는 운남성(雲南省) 국경에 있는 지층에 발견된 것이 오래되었다. 재미있게도 조개 옆에 살아서 빨아먹던 기생물도 화석이 되어서 최초의 기생동물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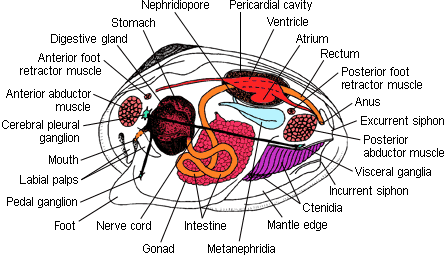 조개도 엄연히 촉각 등을 느끼는 신경구조가 있다. 해면 같은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조개 종류중에는 가리비처럼 간단하지만 눈이 있는 종도 있다.
조개도 엄연히 촉각 등을 느끼는 신경구조가 있다. 해면 같은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조개 종류중에는 가리비처럼 간단하지만 눈이 있는 종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부를 때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째선지 조개류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개명을 당해 정식 명칭과 다르게 불리우고 있다.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방언 중 하나가 굳어진 건가 하면 대부분 그것도 아니다. 그 중 시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들만 해도 참가리비(본명 큰가리비), 명주조개(본명 개량조개), 대합(개조개), 웅피(북방대합) 곰 가죽을 닮은 갈색 패각 때문에 웅피(熊皮)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 당연히 표준어가 아니며, 더러는 운피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이쪽 역시 엉망이다. 근데 원산지인 강릉, 속초 등의 지역 등에서는 또 대합이라고 부른다.(...) 어쩌자는겨.., 칼조개(접시조개), 돌조개(비늘백합), 참소라(피뿔고둥) 등, 그 사례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실제와 다르게 불리우고 있다.
